공존의 여백과 시대의 상처, 예술로 읽는 세 작품
켄 로치 감독의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를 『나의 올드 오크』, 벤 샨의 대공황 시기 회화 《Unemployment》,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섬세한 심리소설 『오, 윌리엄!』. 세 작품은 서로 상실의 풍경과 인간 연대의 조건을 직조하며 오늘의 우리를 마주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세 작품을 비교하며 시대의 무게와 예술의 가능성을 비평적으로 조명한다.
💡 1. 펍의 창문 너머, 침묵하는 공동체의 마지막 장면
켄 로치(Kenneth Charles Loach, 1936~)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는 사회적 혁명의 전면에 서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퇴장과 같은 방식으로 ‘공존’의 의미를 되묻는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북부 잉글랜드의 쇠락한 마을, 그 안의 펍은 더 이상 단순한 술집이 아니게 되었다. 그곳은 억제된 감정이 축적되는 공간이거나, 무너진 연대의 폐허이며, 언어 없는 공동체의 마지막 지층이다.
주인공 TJ는 혁명가도, 영웅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무너지는 공동체를 홀로 지키려는 가장 평범한 시민이다. 시리아 난민 요라와의 우정은 다문화 공존의 상투적 구호가 아닌, 서로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반영한다. 켄 로치는 감정을 조작하지 않는다. 절제된 시선은 오히려 공동체가 잃어버린 감정의 분량을 관객에게 되돌려준다. 이 영화는 ‘공존이 가능하다.’ 선언이 아니라, ‘공존은 가능한가?’ 조용한 질문이다.
TJ는 말을 아끼는 인물이다. 그는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무표정한 얼굴, 조심스러운 제스처, 그리고 펍을 비워주는 침묵은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 ‘함께 있음’은 때로 ‘말없이 버텨줌’에서 시작된다. 로치의 카메라는 이 ‘버팀’의 미학을 오래 응시한다. 폭발하는 분노가 아닌, 견딤의 지속성이 이 영화의 진짜 동력이다. 펍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사회적 ‘위령 제단’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제단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는 의식처럼, 조용하고 엄숙하다.

💡 2. 실업의 얼굴들, 벤 샨 《Unemployment》가 응시하는 것
켄 로치의 영화에 조응하는 회화 작품을 찾자면, 벤 샨(Ben Shahn, American, 1898-1969)의 《Unemployment》(1938)를 들 수 있다. 대공황 시기 미국의 실업자들을 정면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집단 초상을 그리면서도 철저히 ‘개인’을 응시한다. 벤 샨의 인물들은 말이 없다. 침묵한 입술, 무표정한 눈, 기다림으로 가득 찬 자세가 인상적이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적극성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서조차 버텨야만 하는 존재의 패배감이다. 그러나 이 절망의 풍경은 단지 어두운 기록이 아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오히려 체념 속에서 연대를 예비하는 어떤 예민한 감각의 시작이다. 벤 샨의 화폭은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지워진 얼굴들의 회복을 촉구한다. 이 회화의 정서는 켄 로치의 영화가 말하는 ‘지워진 사람들’의 서사와 정확히 맞물린다.
샨의 인물들은 단지 ‘실업’의 상징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시대의 도덕적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노동은 사라졌지만, 존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보기보다 더 거대한 침묵 속에 있다. 우리는 말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 없는 인물들이 때로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 안다. 벤 샨은 그 진실을 한 칸의 회화 안에 박제하지 않고 관람자의 감정 속에 밀어 넣는다. 그것은 시대의 고통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몫’을 묻는 윤리적 요청이다. 바로 그 점에서 벤 샨과 켄 로치는 공명한다. 둘 다 인물을 정면으로 그리되, 시선을 독점하지 않고 분산시킨다. 관객은 화면 밖에서 참여해야만 그들의 고요한 외침을 들을 수 있다.

📌 이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예술과 혁명: 레 미제라블‧카탈로니아 찬가‧직조공의 봉기
💡 3. 『오, 윌리엄!』의 내면적 저항,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Elizabeth Strout, 1956~)의 소설 『오, 윌리엄!』은 외부적 투쟁보다 내면의 파고를 다룬다. 주인공 루시는 전남편 윌리엄과의 여행을 통해, 상실과 거리를 재정립한다. 이 소설은 거창한 갈등도, 감정의 격정도 없다. 오히려 깊은 고요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낚아채는 섬세한 내면의 기록이다. 루시는 인간관계의 균열, 이해의 불가능성,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일상을 응시한다. 공존은 멀찍이 떨어져 있되, 여전히 서로를 향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오, 윌리엄!』의 문장은 로치의 영화 속 TJ의 말 없는 헌신, 벤 샨의 침묵한 실업자들과 궤를 같이한다.
루시가 말하는 “나는 언제나 놀라곤 했다.” 이 표현은, 인간이 타인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그 무지의 상태에서조차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이 ‘시도’가 바로 공동체의 씨앗이다. 우리는 늘 ‘사라진 것들’을 떠올릴 때만 무엇이 소중했는지 안다. 루시는 그런 회상을 통해 다시 앞으로 걸어간다. 그녀의 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많은 것을 살핀다. 『오, 윌리엄!』은 상실을 안은 자가 어떻게 타인을 품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심리적 연대의 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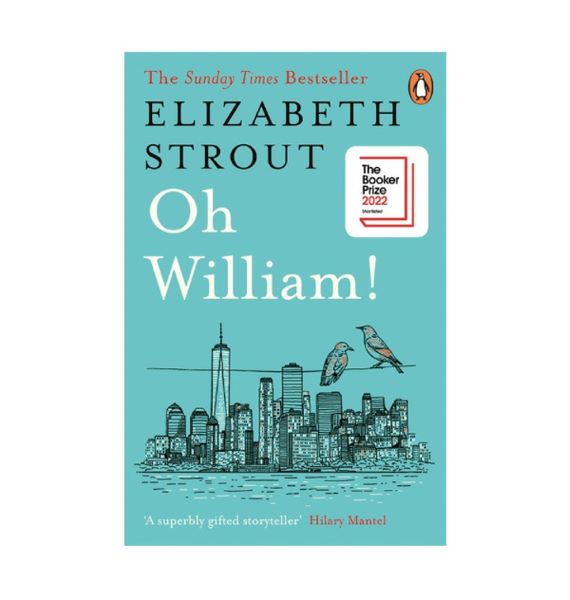
💡 4. 존재의 무게와 연대의 감각
세 콘텐츠는 서로 다른 매체에 담겼지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영화에서 펍은 단절된 공동체의 마지막 쉼터이고, 《Unemployment》는 체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집단 초상이다. 『오, 윌리엄!』은 그 모든 시대적 격랑을 지나온 내면의 언어이자, 감정의 귀환이다. 켄 로치의 영화와 벤 샨의 회화가 만나면, 우리는 ‘사회적 침묵’의 파열음을 듣게 된다. 말은 사라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말한다.
영화와 소설이 맞닿을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한다. TJ와 루시는 전혀 다른 인물이지만, 둘 다 ‘끝까지 함께 있음’을 선택한다. 회화와 소설이 만날 때, 침묵은 이미지와 내면 서사의 두 축이 되어 존재의 밀도를 완성한다. 하나는 외면의 풍경이고, 하나는 내면의 지도다. 세 작품이 교차하는 지점은 결국 ‘연대의 조건’에 대한 사유다. 말이 아닌 눈짓, 선언이 아닌 기다림, 돌봄이 아닌 견딤—그 속에서 공동체의 시작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이상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느린 감정, 사라진 사람을 기억하는 자세, 불완전한 관계를 견디는 연습이다. 세 작품은 그렇게 말한다. 살아가는 일이 곧 저항이며, 끝까지 곁에 남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을.
'문화&예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 야당, 흥행할까: 진짜 범죄와 정보가 권력인 곳 (0) | 2025.04.20 |
|---|---|
| 〈센과 치히로〉× 클림트 × 『이방인』 : 상실과 회복 (0) | 2025.04.20 |
| 괴물이 시대를 비추다: <프랑켄슈타인> (0) | 2025.04.17 |
|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기대평 (0) | 2025.04.16 |
|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왜곡된 역사와 싸우는 용기 (0) | 2025.04.15 |